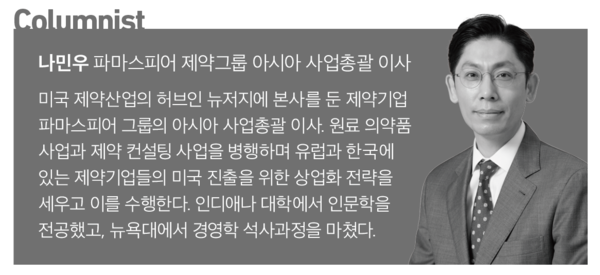2007년 1월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아이폰을 세상에 소개할 때 함께 주목받았던 것이 바로 그가 신었던 뉴발란스(New Balance - 992) 운동화다. 당시 창립 100주년을 맞았던 뉴발란스는 미국 보스턴에서 시작해 현재 스포츠 브랜드 매출 기준, 나이키와 아디다스 다음으로 큰 회사가 되었다.
이들이 시작한 것 같은 레트로풍의 운동화 디자인은 브랜드를 초월해 트렌드를 만드는 모양새다. 예전에는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요즘은 자세히 보아야 어떤 브랜드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서로 비슷해 보인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이탤릭체의 알파벳 “N” 이 유일한 수단임에도, 뉴발란스는 다양한 모양, 크기, 색깔, 소재 등의 조합으로 수백, 수천 가지 다양성을 만들어 내고 이를 유행으로 이끌어낸다.
뉴발란스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신발마다 여러 복잡한 소재들을 균형 있게 조합해 하나의 외형을 이룬다. 여기에 형태와 디자인적 차이를 두기도 한다. 가령 영국과 미국 등에서 만든 모델들은 신발 외관에 이를 표시하고 모델명으로도 구분해 프리미엄 가격대를 만들었다. 다양한 색의 조합으로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전략도 쓴다.
다양한 선택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가장 대중적인 주력 모델들과 시너지를 만들며 회사의 매출을 높였다. 소비자는 선택의 자율성과 비교와 취향이라는 개인적 욕구를 해소하며 구매를 통해 만족을 얻는다. 이는 음료회사에서 가판대의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다종의 제품을 구비하는 전략으로 주력 제품의 매출을 유지하는 방식과 같은데, 이를 선제적 다종화(Preemptive Diversification)라 한다.
만약 의약품을 가지고 이렇게 전략을 짠다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소비의 도구로 삼아 이렇게 상업적인 방식으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제품군 확장을 통해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점하는 일들이 불법은 아니겠지만, 의약품은 규제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 그리고 법적, 문화적,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소위 ‘까다로운’ 제품들이다. 그럼에도 제약사, 특히 신약을 개발해 출시하는 걸출한 블록버스터 기업들도 사실 뉴발란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한다.
미국 대형 제약사인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의 대표 브랜드, 타이레놀(TylenolⓇ)은 1955년 처음 시장에 소개된 후로 현재 7개 제품 카테고리 안에 무려 35개의 서로 다른 제품들이 타이레놀 브랜드로서 판매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매출을 내는 제품은 역시 아세타미노펜(Acetaminophen)을 주성분으로 하는 해열, 진통제 품목들이다. ‘통증’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브랜드인 타이레놀은 이런 제품의 다양성을 가지고 통증에 집중된 효능과 효과를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또 다양하게 제공한다.
미국에서 약국체인에 가보면 타이레놀 제품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의 모든 타이레놀 제품은 눈높이와 가장 가까운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다. 이렇게 제조사가 다양한 제품라인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소비자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공간을 통째로 선점하기 위해서다. 매장 내 좁은 가시거리에서 선택의 폭을 자사의 제품들로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업방식을 카테고리 리더십(Category leadership 또는 Category captaincy)이라고 하는데, 앞서 언급했듯 이 방식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곳은 편의점, 특히 주유소와 함께 있는 편의점이 좋은 예이다. 쇼핑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주유소 편의점에서는 선택의 시간이 별로 없다. 편의점 인기 품목인 에너지 드링크는 눈에 잘 띄고 손에 가까이 잡혀야 하는 접근성이 매출과 직결된다. 레드불(Red BullⓇ)과 몬스터(Monster EnergyⓇ)와 같은 주력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들은 이미 좋은 위치에 자사의 다양한 제품들을 포진시켜 경쟁사 제품에게는 관심과 선택이 가지 않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사실 제조사뿐 아니라 유통사들도 판매증진에 보다 효과적인 카테고리 리더십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방향을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돌려보자.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기업에서는 어떻게 시장 선점을 할까? 일반 소비제품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도구가 ‘특허와 독점권’이다.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는 일의 시작이며 마침과도 같다. 신약물질이 특허로 출원되면 20년이라는 시간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특허 출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그래야 먼저 이 약물이 인체에 안전한지, 어떤 형태로서 얼마나 또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를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받고, 규제승인를 거쳐 시장에 빠르게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약물질특허는 제네릭, 즉 복제약이 허가를 받기까지 오롯이 시장을 독식할 주요 도구가 된다.
마침내 신약물질특허가 마치게 되더라도 신약개발업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특허들을 준비해 물질특허가 끝나는 시점을 기해 출원하는데 제형특허, 용도특허, 제법특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약은 앞선 타이레놀의 예와 같이, 조금씩 다른 형태 또는 개선된 효능, 효과 등을 기준으로 제품군을 형성하고 이미 경쟁이 시작된 시장에서 기존 위세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전략으로서 사업 방향을 이끈다.
또 하나는, 특허와 상관없이 이미 식약처로부터 규제독점권(Regulatory Exclusivity)을 받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NCE(New Chemical Entity)라고 불리는 신약물질에 5년 독점, 오펀드럭(Orphan Drug)이라 불리는 희귀 약품에 7년 독점, 소아용(Pediatric Use)으로 승인되는 경우에 6개월 독점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제네릭 품목의 시장진입을 규정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듯 특허와 규제독점은 신약개발 기업뿐 아니라 복제약 제조사에서도 면밀한 조사와 준비를 통해 특허를 회피할, 그리고 규제승인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전략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의약품 시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우리 의약품이 다른 나라에 진출을 준비할 때, 복제약의 경우 이미 판매 중인, 대조약(RLD: Reference Listed Drug)이라 부르는 오리지널 제품의 구성을 볼 필요가 있다. 신약이 시장에서 판매되면서 투여강도(Dosage Strength)가 다양화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유명한 리피토(LipitorⓇ)라는 약은 현재 미국에서 처방약으로 10mg, 20mg, 40mg, 80mg 이렇게 네 가지 정제(Oral Tablet)로 구성되어 있다. 리피토는 브랜드로서 아토바스타틴(Atorvastatin Calcium)이라는 동일성분을 쓰지만 함유량이 서로 다른 제품으로 묶음을 이루는데, 이를 번들링 전략(Bundling Strategy)이라 한다. 편의점 에너지드링크와 사뭇 비슷하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복제약으로 진출하는 경우, 대조약에 번들링이 있는지를 확인해 가급적 제품 구성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유는 경구용 정제의 경우 유통 시 도매상에서 대부분 번들링의 형태로 구매하기 때문이다. 어렵게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우리 제품이 하나 있더라도, 품목 구성이 부족하면 초기 시장 진입과 판매망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사업 실패의 이유는 성공의 이유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실패의 이유를 개인적으로 두 가지 들자면 첫 번째는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가져야 할 실체, 즉 위치를 미리 보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가령 실체를 바르게 보았다 하더라도 실무를 통해 그 위치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번 칼럼은 다양한 제품군을 무기로 삼은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선점과 독점, 그리고 현지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많은 선례들을 업계에 남겨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머지않아 시장을 주도할 혁신적 글로벌 신약들도 한국기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을 믿고 간절히 응원하는 바이다.